
창생과 시민
박명규 서울대 교수, 사회학
오래된 문건인데 현재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은 글이 적지 않다. 백여 년 전 동학농민군이 내걸었던 ‘백산창의문’ 역시 그런 자료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다”라는 이 격문을 2016년 가을의 시점에서 다시 읽으면서 새삼 ‘창생’이라는 말과 ‘창의(의를 든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 두 단어 모두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창생은 모든 생명을 뜻하는데 인간은 물론이고 자연계의 모든 생명까지도 아우르는 의미를 담는다. 아마도 평범한 백성, 도탄에 빠진 이웃의 어려움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이 있어야만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다. ‘의를 든다’라고 번역된 창의라는 말도 요즘은 낯설지만 ‘의’라는 말이 오랫동안 사용된 역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논어의 ‘見利思義’(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라는 가르침은 오랫동안 선비의 몸가짐이었고 안중근은 이 경구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스스로의 원칙으로 삼았다.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올바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담겨있기에 이 두 단어는 지금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뭇 생명이 행복한 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면 이런 단어에 별다른 공감을 느끼지 못할 터이다. 이 말에 공감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처럼 현재도 여전히 삶이 어렵다는 반증이리라. 실제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은 가중되는데 신뢰할만한 지도력이 보이지 않고 사회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낸다.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이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안팎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지금까지 사회를 지탱해온 중산층의 가장들이 갑자기 다가온 고령화 시대를 불안스레 마주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대화 속에 금수저, 흙수저 같은 말이 당연한 것처럼 회자되고 취업과 결혼이 최대 숙제가 되어버린 현실이 ‘창생’과 ‘창의’라는 말을 다시 곱씹게 만드는 것이겠다.
하지만 21세기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창생과 창의 사이를 연결할 무엇인가가 결핍되어있다는 생각도 든다. 창생이라는 집합명사로는 포착되지 않는 개별성, 고유성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가 그 고리가 아닐까 싶다. 생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개별자를 통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개인을 무시한 전체의 상찬이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생을 구하려는 마음과 개인을 보듬는 섬세함을 함께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유한 개성을 그 존재감의 기반으로 하는 이들을 시민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의 창생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늘 다양하고 대립적이며 불일치하지만 그 생동력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력이다.
일제의 민족탄압이 극에 달했던 1940년대 초반,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패, 경, 옥 등 이국소녀들의 이름과 어머니를 불렀다. 아마도 그냥 민족애라든지 인류애라는 말로 환원할 수 없는 개개인의 존재, 그 고유함을 드러내고 싶었을지 모르겠다. 별을 주목한 것도 그 스스로 하나의 존재로 빛나는 개체, 한 인간의 존엄함을 느끼고싶었던 것이 아닐까. 창생이 시민으로 깨어나는 곳, 공동체와 개인이 어우러지는 곳, 온갖 풀과 꽃이 함께 피어나는 봄날 들녘같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21세기 ‘창의’가 아닐까. 깨어난 시민들로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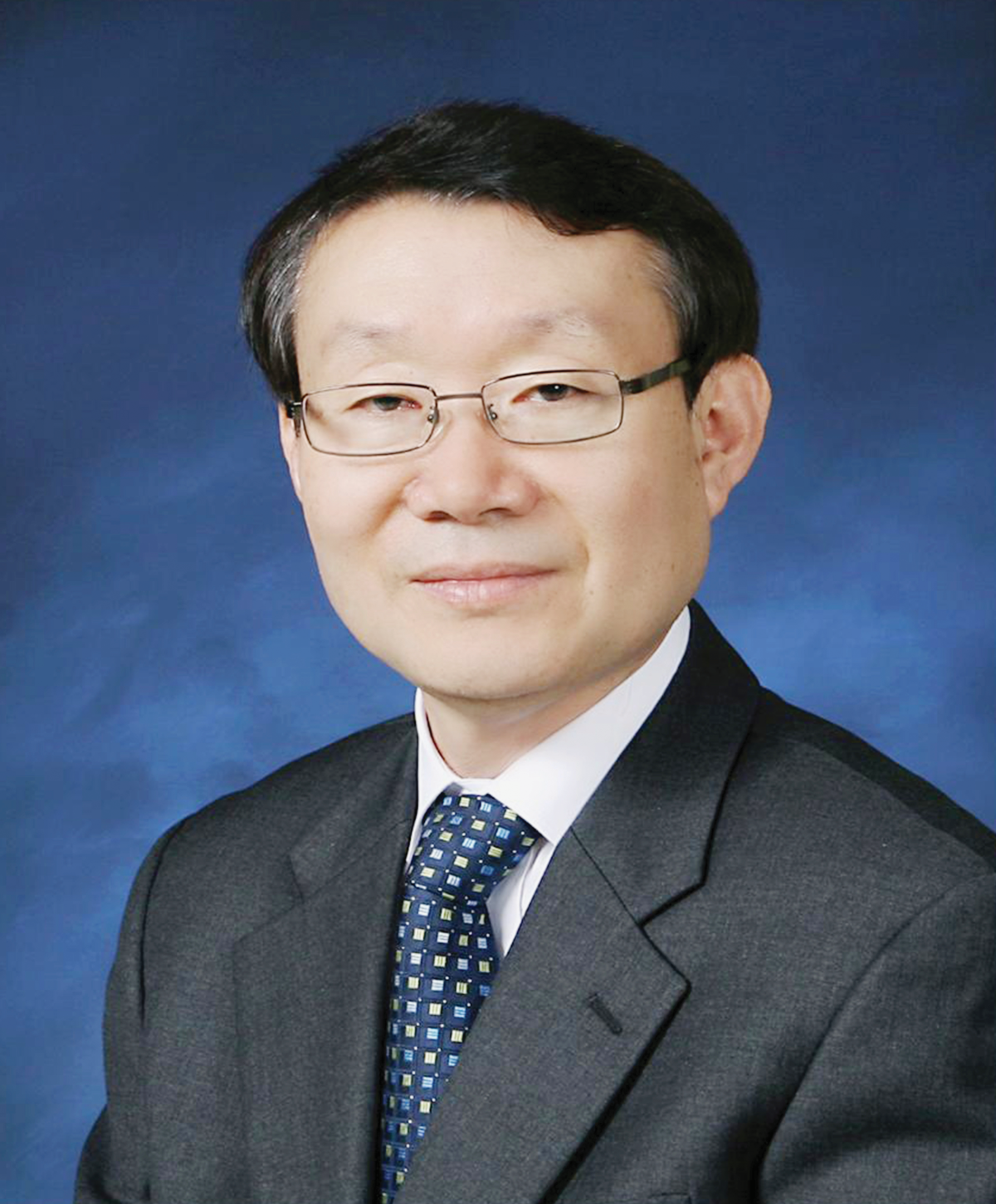
박명규 (朴明圭, Park Myoungkyu)
사회학자, 서울대학교 교수. 경남 함양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 199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연구분야는 역사사회학, 한국사회사, 남북관계론, 민족주의, 종교사회학 등이다. 육군사관학교와 전북대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의 하바드 엔칭연구소 초빙연구원, UC 버클리 대학 초빙교수, UC 어바인 방문교수, 스탠포드 Humanities Center International Visitor, 독일 베를린 자유대 방문학자를 지냈다.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북한사회문화학회 회장, 북한연구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 한국사회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창비, 2012), [국민,인민,시민-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009), [한국근대국가형성과 농민] (문학과지성사, 1997)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